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이승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Toss Insight, 대표 손병두)가 최근 발간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는 한국 마이데이터 제도의 현주소를 “전송은 의무화됐지만,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미완성”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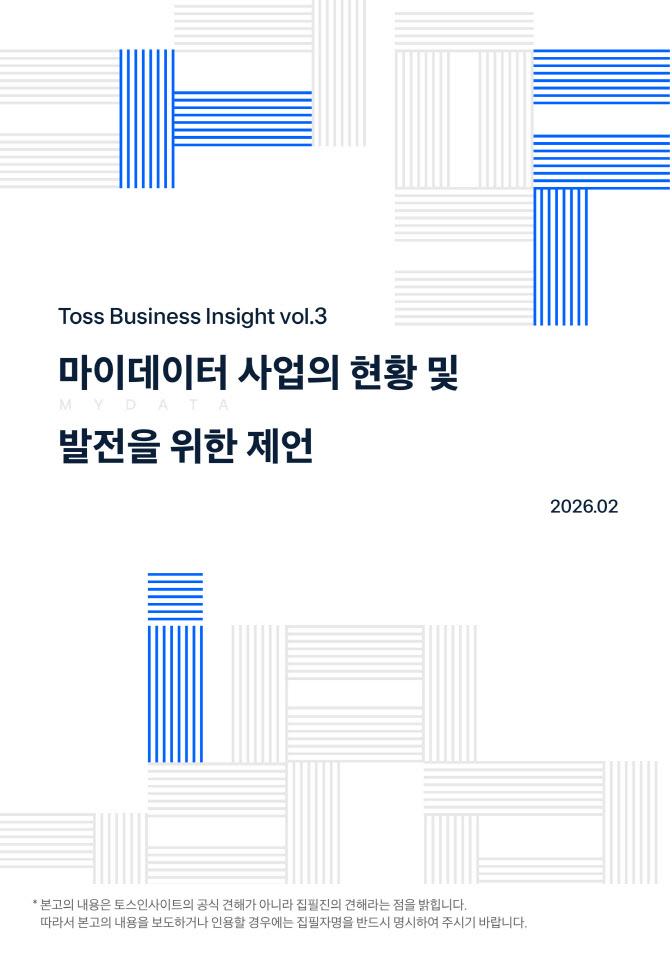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스마트 디스클로저(Smart Disclosure), 영국의 미데이터(midata), 유럽연합(EU)의 마이데이터(MyData) 흐름을 수용해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장 강력하게 제도화한 국가 중 하나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명문화하고, 표준 API와 인가제를 동시에 구축한 점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전송은 표준화됐지만, 수익화 모델은 공백
그러나 제도의 진전과 달리 시장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보고서는 “전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안착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마이데이터를 ‘규제 준수 비용’이 아닌 ‘가치 창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는 자산 통합 조회, 소비 패턴 분석, 신용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돼 있지만, 데이터 범위 제한과 겸영 금지, 높은 API 구축·운영 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 확장에는 제약이 크다는 평가다.
데이터 전송 의무는 강하게 부과된 반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비금융 확산은 초기 단계…규제 분산이 발목
비금융 마이데이터는 상황이 더 어렵다. 교육·고용, 의료·헬스케어, 모빌리티, 에너지, 유통, 공공 분야 등으로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표준, 전송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업권별로 전송요구권이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해석 부담과 비용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 모델로 API 연계 수수료, B2B 데이터 분석, 추천·중개, 플랫폼 모델, 데이터 거래·유통 등을 제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데이터 과금 구조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주문했다.
전송 의무 확대 중심의 규제 기반 접근에서 벗어나, 참여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활용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API 비용 구조 개선, 공공과 민간이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 구조 설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데이터 이동 자체보다 ‘어떻게 활용해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비식별 데이터 가공과 데이터 상품화, 결합·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이데이터가 실질적인 데이터 비즈니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는 기술이나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라며 “권리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면 제도는 확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